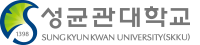-

- [학생실적] 신소재공학과 김지원 원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 신소재공학과 김지원 원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신소재공학과 김지원 원우는 2025년 10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2025 기후에너지 일자리 박람회 인력양성 우수성과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연구실과 학생을 선정·격려하고, 사업의 우수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전해 반응의 효율을 좌우하는 촉매의 성능과 내구성 문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 작성일 2025-10-22
- 조회수 2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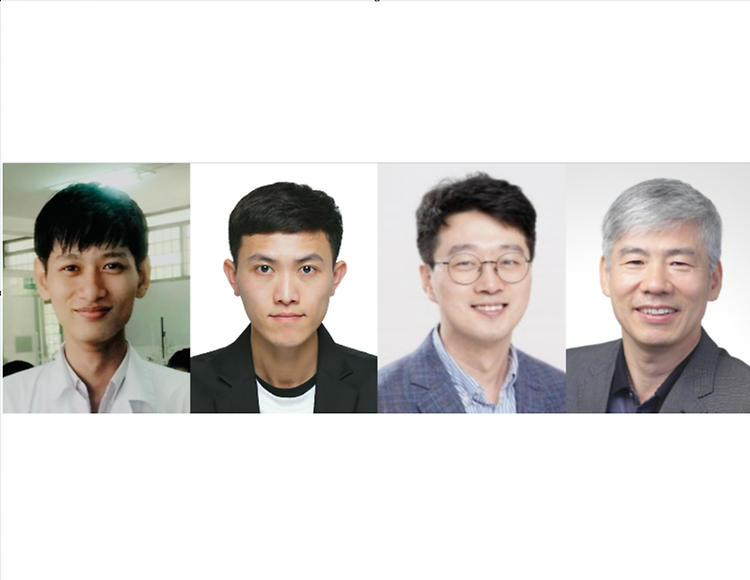
-

- [동문] 김건한 박사 (신소재공학부 08학번), 부경대학교 융합소재공학부 조교수 임용
- 김건한 박사 (신소재공학부 08학번), 부경대학교 융합소재공학부 조교수 임용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부 김건한 박사(학부 08학번)가 국립부경대학교 융합소재공학부 재료공학전공 조교수로 올해 9월 임용되었다. 김건한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2014년 졸업하였고, 2021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영국 University of Oxford (2021년 9월-2023년 2월)와 미국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2023년 3월-2024년 9월)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쳤다. 이후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연수트랙 과제에 연구책임자 선정되어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9월 국립부경대학교 융합소재공학부 재료공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김건한 박사는 학위 과정 중 태양에너지 변환 촉매반응인 인공광합성 연구 분야에 매진했으며, 이산화탄소 환원, 산소환원을 통한 과산화수소 생성, 물 분해 등의 세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dvanced Energy Material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등 권위있는 SCIE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후, 영국 University of Oxford와 미국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에서 전기화학 변환촉매로 연구분야를 확장하였고, 저농도 질산염 환원을 통한 암모니아 생산, 바이오매스 변환 반응인 HMF 산화를 통한 FDCA 생산, 이산화탄소 환원을 통한 에틸렌 생산과 구리 촉매 재구조화 규명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성가능한 지속가능 PFAS 흡착제 개발 연구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 수행의 결과로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Advanced Materials, ACS Catalysis 등 권위있는 SCIE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제하였다. 김건한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학자와 연구자로서의 자세와 지식 등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출신으로서 항상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고 있다. 앞으로도 청정에너지재료 및 환경재료, 에너지 변환 소자 연구에 기여해 성균관대학교를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김건한 박사는 국립부경대학교 부임 후, 막전극접합체 기반 에너지 변환 소자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작성일 2025-09-17
- 조회수 1771
-

- [연구] 이보람 교수,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용화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색 변환 가이드라인 제시
- 신소재공학부 이보람 교수가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창순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차세대 색 변환 디스플레이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Nature Electronics)에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높은 흡광계수, 우수한 색 순도, 손쉬운 색 조절 특성을 지닌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납(Pb)을 포함하고 있어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
- 작성일 2025-09-16
- 조회수 3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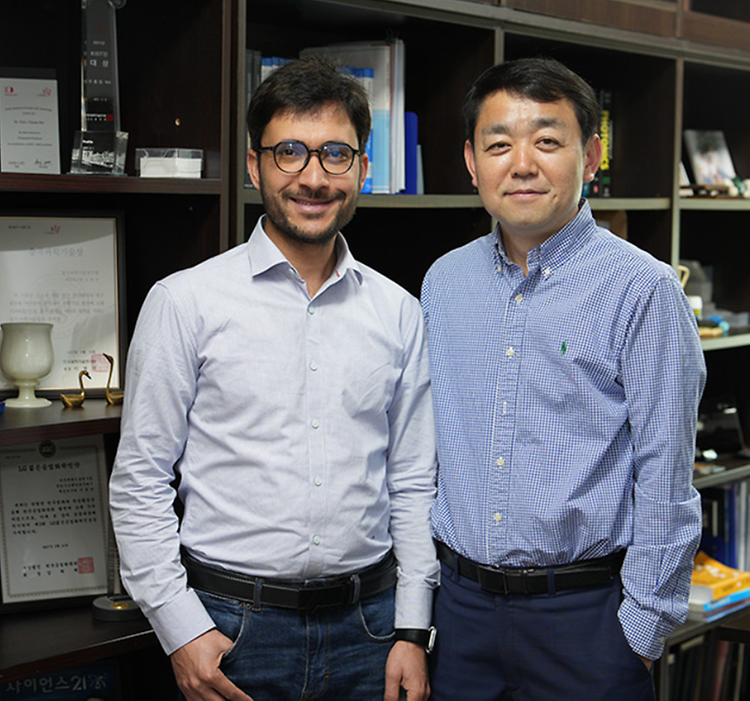
- [연구] 구종민 교수 연구팀, 극한 우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자파 차폐 및 적외선 은폐·감지 기능을 갖춘 맥신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 신소재공학과 구종민 교수 연구팀은 숭실대학교 정영진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맥신(MXene)과 탄소나노튜브(CNT)로 구성된 유연하고 경량이며 기계적으로 견고한 야누스 필름구조의 다기능성 맥신 하이브리드 소재를 개발하였다. 이 혁신적인 필름은 극저온부터 고온까지의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우수한 전자파 차폐 (Electromagnetic shielding) 기능과 함께, 적외선 (Infrared) 은폐(Camouflage)/감지(Detection)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제1저자인 Dr. Tufail Hassan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저널인 Nano-Micro Letters(IF: 31.6)에 게재되었다. 현대의 국방, 항공우주, 웨어러블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고온, 극저온, 열충격 등 극한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인 전자파 및 적외선 신호 제어가 가능한 다기능성 소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맥신은 뛰어난 전기전도도와 낮은 적외선 방사율 (emissivity)을 바탕으로 유망한 후보 물질로 주목 받고 있으나, 기계적 강도 및 열충격 내구성의 한계로 인해 실사용이 제약이 있다. 본 연구팀은 고결정성의 Ti₃C₂Tₓ 맥신 나노소재를 합성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CNT 필름과 결합하여 이종계면 기반 야누스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 결과, 얇은 15μm 두께의 맥신/CNT 야누스 필름은 X-밴드 마이크로웨이브에서 72dB의 전자파 차폐 성능, 0.09이하의 적외선 방사율, 우수한 적외선 감지 민감도등 뛰어난 다기능 특성을 동시에 구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작된 필름은 우주환경을 모사한 극저온 및 급격한 충격에서도 기계적·구조적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하여, 기존의 소재들을 능가하는 경량화, 유연성, 기계적 강도, 극한환경 내구성, 전자파 차폐도, 및 적외선 은폐 및 감지 기능을 모두 확보하였다. 이번 연구는 전자파 및 적외선 차폐/스텔스 소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군사, 항공우주, 웨어러블 전자장치 등 극한 환경에 강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중견연구자사업 (2022R1A2C3006227), 나노 및 소재 사업(2021M3H4A1A03047327),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미래 모빌리티 동작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주파/고출력 전자파 솔루션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CRC22031-00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Nano Micro Letters, 2024, 16, 216」 (IF 27.4, JCR 분야 1.9%) 최신 호에 게재됐다.
-
- 작성일 2025-05-22
- 조회수 784
-

- [연구] 이내응 교수 연구팀, 생체 촉각기관 모사한 '지능형 인공 촉각 수용기' 개발
- 신소재공학과 이내응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촉각 인지 시스템에서 착안하여 유사 시냅스의 기능과 구조를 모사한 지능형 인공 촉각 수용기* 어레이*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능형 센서 플랫폼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 촉각 수용기: 외부의 자극 (압력, 진동,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활동 전위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하는 역할 * 어레이: 단일 소자가 아닌 다수의 소자로서 집합적으로 동작하도록 제작된 구조 최근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역할은 전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피지컬 AI(Physical AI)는 미래 산업에서 자율 시스템의 핵심 기반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피지컬 AI에서 데이터 입력은 센서를 통해 시작되며, 이에 따라 센서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고성능 신호처리 능력을 갖춘 인체 체성감각계의 메커니즘을 모사한 지능형 센서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인체의 감각기관이 정보를 처음 처리하는 방식, 즉 감각 수용체와 신경 말단 사이의 ‘유사 시냅스 구조’에 주목해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사람의 피부 속 느린 적응형(메르켈)과 빠른 적응형(파시니안) 촉각 수용체에서 영감을 받아, 두 가지 적응 특성을 모두 반영한 16개의 감각 센서부와 시냅스부(시냅틱 트랜지스터)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생긴 마찰전기 센서층과, 자극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시냅틱 트랜지스터를 단일 구조로 구현한 것으로, 느린 자극과 빠른 자극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실험을 통해, 이 센서는 기계적인 자극의 강도·빈도·형태에 따라 시냅스 가중치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전체 데이터의 10% 이하만을 활용해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질감과 표면 패턴을 인식할 수 있어, 기존 기술에 비해 데이터 처리 효율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각 자체에 인공지능적 기능이 내장된 센서는 초저전압, 초저전력, 고효율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능형 로봇, 뉴로모픽 감각 시스템, 웨어러블 전자피부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외부 환경 데이터를 센서 단계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어, 향후 고속·고효율 자율 AI 시스템 구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자지원,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 사업, 교육부의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중점연구소지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성균관대 홍석주 석박통합과정생과 이유림 박사, 아타누 배그 박사가 공동제1저자로 참여하였고, 이내응 교수가 교신저자로 진행한 이 연구 성과는 재료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학술지‘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에 25년 4월 28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Bio-inspired artificial mechanoreceptors with built-in synaptic functions for intelligent tactile skin ※저널명: Nature Materials ※저자명: 이내응(교신저자), 홍석주, 이유림, 아타누 배그(제1저자), 김효수, Trang Quang Trung, M Junaid Sultan, 문동빈 (공동저자) 인간의 느린적응와 빠른적응 촉각 수용체가 동시에 모방된 초고효율, 초고전력, 초저전압 지능형 인공 촉각 수용기 개발 (왼쪽부터)성균관대 이내응 교수, 홍석주 석박사통합과정생, 이유림 박사, 아타누 배그 박사
-
- 작성일 2025-05-15
- 조회수 960
-

- [동문] 신소재공학과 박희경 박사, 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조교수 임용
- 신소재공학과 박희경 박사, 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조교수 임용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과 및 다기능나노바이오 연구실 박희경 박사(석박통합 15학번)가 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조교수로 올해 3월 임용된다. 박희경 박사는 2020년 8월 “A study on two-dimensional Molybdenum Disulfide field-effect transistor for sensor applications" (지도교수 김선국)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에서의 박사후연구원 과정 및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의 책임연구원 과정을 거쳐 올해 경기대학교 전자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박 박사는 김선국 교수의 지도 아래 차세대 2차원 반도체의 물성 및 소자‧센서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dvanced Materials, ACS Nano 등 권위있는 SCIE 저널에 논문을 21편을 게재하였다.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후,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 Luke P. LEE 교수 연구실에서 인체의 nuclear pore complex를 모방하는 나노구조체 기반 고감도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며 세계적인 연구진과 협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1.4nm 향 Gate-All-Around (GAA) 구조의 시스템반도체 소자 선행 개발을 진행하며, GAA 및 C-FET 구조 설계 및 공정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핵심자산 선정 및 삼성전자 주최 박사경진대회에서 동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희경 박사는 “훌륭하신 지도 교수님 뿐만 아니라 신소재공학과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귀중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반도체 및 차세대 소자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박희경 박사는 경기대학교 부임 후, 저차원 나노반도체 연구를 기반으로 차세대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소자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작성일 2025-03-17
- 조회수 6297
-

- [동문] 신소재공학과 임혜린 박사, 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조교수 임용
- 신소재공학과 임혜린 박사, 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조교수 임용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과 및 다기능나노바이오전자 연구실 임혜린 박사 (석박통합 16학번)가 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조교수로 올해 3월 임용된다. 임혜린 박사는 2021년 2월 “To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and Beyond: Synthesis, Applications, and Interaction with Organic Materials”(지도교수 김선국)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거쳐 올해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임혜린 박사는 김선국 교수의 지도 아래 향후 Si을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는 2차원 반도체 물질을 합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합성된 2차원 반도체의 물성을 활용해 다양한 소자를 개발하고 여러 응용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해당 연구들은 Nature Communications, Advanced Materials, ACS nano 같은 저명한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연구재단] 창의도전, [PBRC] Global Talent Fostering Program 및 [연구재단]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 과제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로 선정되어 수행했다. 임혜린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오픈되어 있는 연구시설이 연구 수행 및 역량 강화에 탁월한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박사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해 볼 기회가 간절했는데 성균관대학교 교내·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때 지도교수인 김선국 교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현재 임혜린 박사는 경희대학교 부임 후 첨단 나노 반도체 연구실 (Advanced Nanoelectronics & Semiconductor Lab)을 운영 중이며, 차세대 반도체 물질을 Si 기반BEOL에 적용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이를 기반한 초집적 CFET 소자 개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작성일 2025-03-14
- 조회수 7764
-

- [일반] 부트캠프 성과교류회 개최
- 성균관대학교 부트캠프사업단이 지난 1년간의 교육프로그램 및 사업성과를 한눈에 조망하고, 향후 발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수원 노보텔호텔에서 "부트캠프사업단 1차년도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부트캠프 참여 교수 및 참여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과교류회는 그간 진행된 성균관대 부트캠프사업의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고 부트캠프연구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의 성과 발표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을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의 도움을 받아 강사를 초청하여 취업 강연을 진행하였다.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디스플레이특성화대학원사업을 소개함으로써 대학원 연계로 이어지게 하였다. 부대 행사로 진행된 "부트캠프 연구과제 구두 및 포스터 발표 시상식"에는 사업 참여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로 참여한 우수 성과에 대하여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 기업 관계자 등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시상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이론적 학습과 동시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성균관대 부트캠프사업단은 이번 성과교류회를 계기로,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 하여 인재 양성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 작성일 2025-02-25
- 조회수 3475
-

- [연구] 신소재공학과 출신, 울런공대 김정호 교수(신소재공학과 겸임교수), 2024년 세계 상위 1% 연구자(HCR) 선정
- 신소재공학과 출신, 울런공대 김정호 교수(신소재공학과 겸임교수), 2024년 세계 상위 1% 연구자(HCR) 선정! ▲ 김정호 교수 우리 대학은 클래리베이트(Clarivate)사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상위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 HCR) 선정 결과에서 소속 교원 10명이 HCR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사립대학 1위를 차지했다. HCR은 분야별로 논문이 상위 1%에 해당하는 피인용 횟수를 기록한 HCP(Highly Cited Paper) 보유 연구자를 의미하며, 연구 성과의 질과 영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 기준이다. 2024년 발표에서는 전 세계 59개 국가 및 1,200여 기관에서 6,886명이 HCR로 선정되었고, 국내에서는 12개 분야에서 총 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성균관대는 △서울대(12명) △성균관대(10명) △UNIST(8명) △한양대(6명) △연세대(5명) △고려대(5명) 순으로 선정되며, 국내 대학 중 2위, 사립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선정된 성균관대 연구자는 △박남규 교수(재료과학, 8년 연속) △이영희 교수(크로스필드, 7년 연속) △안명주 교수(임상의학, 6년 연속) △박근칠 교수(임상의학, 5년 연속) △이진욱 교수(크로스필드, 4년 연속) △무함마드칸 교수(컴퓨터과학, 4년 연속) △임호영 교수(크로스필드, 3년 연속) △김대식 교수(크로스필드, ’20~’21 선정) △신현석 교수(크로스필드, 신규) △김정호 교수(크로스필드, 신규)이다. 특히, 박남규 교수는 세계 최초 안정적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며 상용화에 기여한 업적을 통해 국내 최초 종신 석좌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이영희 교수는 7년 연속 크로스필드 분야 HCR로 선정되어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신규 HCR로 선정된 신현석 교수는 올해 출범한 이차원양자헤테로구조체연구단의 단장으로 활약 중이며, 본교 졸업생인 김정호 교수의 선정은 성균관대 연구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지범 총장은 “성균관대의 연구 성과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학문 활동의 결과로, 인류와 미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연구 영향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작성일 2025-02-25
- 조회수 6966
- 1
- 2
- 3
- 4
- 5
- 6
- 7
- 8
-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기
 발전기금
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