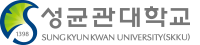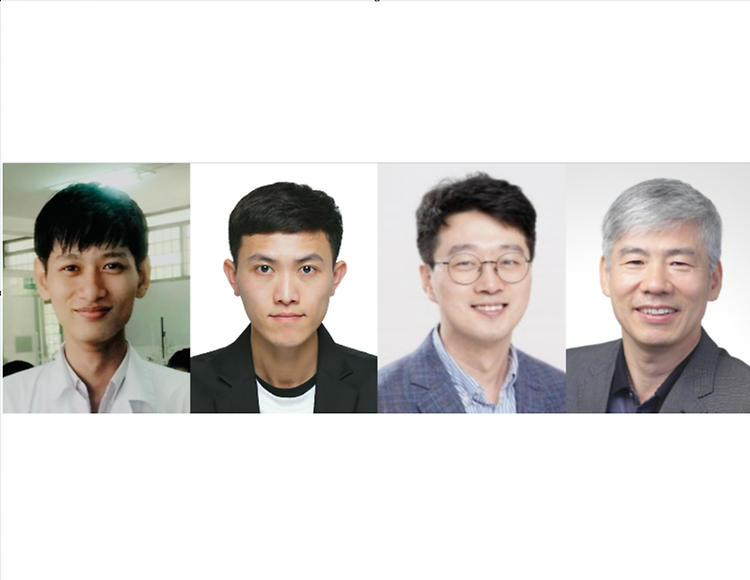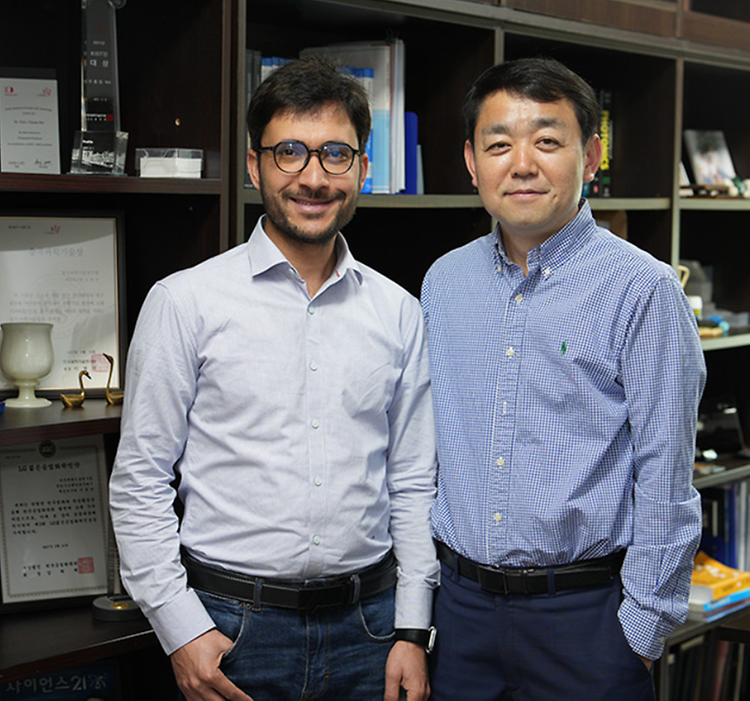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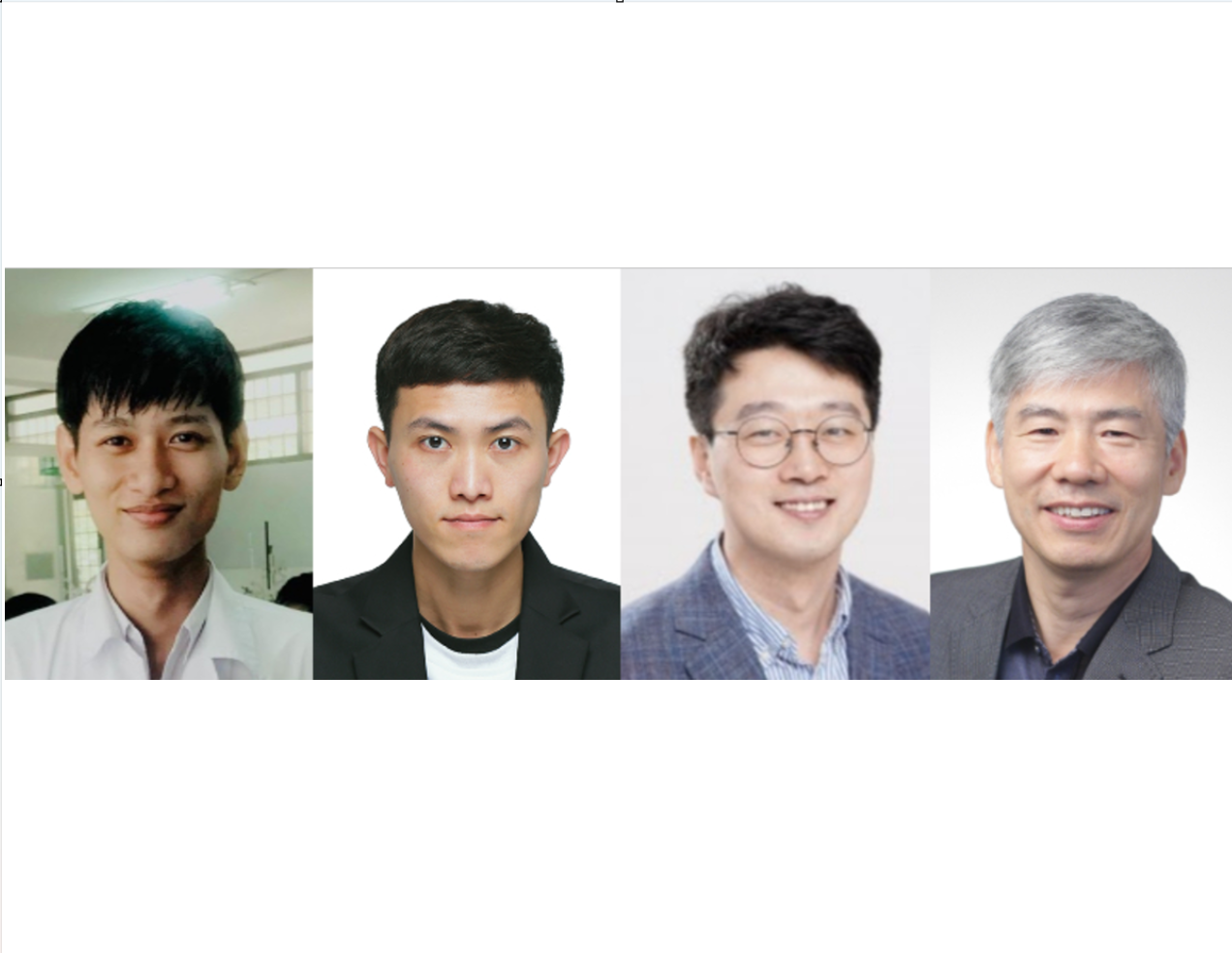
신소재공학부 이내응˙김명길 교수 공동 연구팀, 압전 성능 3배 이상 높인 신소재 개발
2025-10-02신소재공학부 이내응·김명길 교수 공동 연구팀, 압전 성능 3배 이상 높인 신소재 개발 - ‘부서지기 쉬운 센서 소재’ 한계 극복… 초음파 감지·웨어러블 기기 활용 기대 - 2차원 결정 구조 가진 황화물 에어로겔과 고분자 결합해 세계 최초 성과

이보람 교수,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용화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색 변환 가이드라인 제시
2025-09-16신소재공학부 이보람 교수가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창순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차세대 색 변환 디스플레이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Nature Electronics)에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높은 흡광계수, 우수한 색 순도, 손쉬운 색 조절 특성을 지닌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납(Pb)을 포함하고 있어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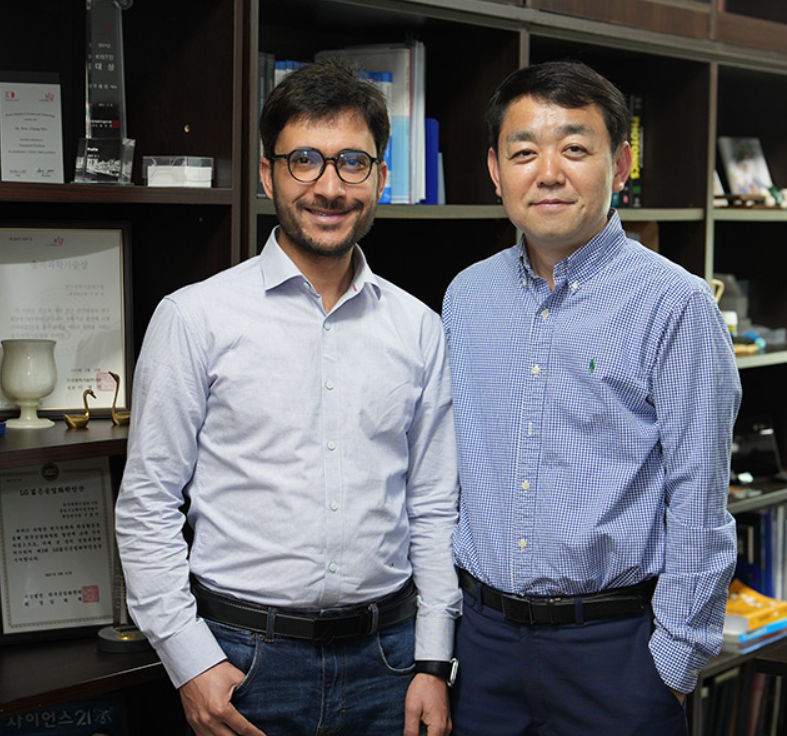
구종민 교수 연구팀, 극한 우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자파 차폐 및 적외선 은폐·감지 기능을 갖춘 맥신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2025-05-22신소재공학과 구종민 교수 연구팀은 숭실대학교 정영진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맥신(MXene)과 탄소나노튜브(CNT)로 구성된 유연하고 경량이며 기계적으로 견고한 야누스 필름구조의 다기능성 맥신 하이브리드 소재를 개발하였다. 이 혁신적인 필름은 극저온부터 고온까지의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우수한 전자파 차폐 (Electromagnetic shielding) 기능과 함께, 적외선 (Infrared) 은폐(Camouflage)/감지(Detection)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제1저자인 Dr. Tufail Hassan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저널인 Nano-Micro Letters(IF: 31.6)에 게재되었다. 현대의 국방, 항공우주, 웨어러블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고온, 극저온, 열충격 등 극한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인 전자파 및 적외선 신호 제어가 가능한 다기능성 소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맥신은 뛰어난 전기전도도와 낮은 적외선 방사율 (emissivity)을 바탕으로 유망한 후보 물질로 주목 받고 있으나, 기계적 강도 및 열충격 내구성의 한계로 인해 실사용이 제약이 있다. 본 연구팀은 고결정성의 Ti₃C₂Tₓ 맥신 나노소재를 합성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CNT 필름과 결합하여 이종계면 기반 야누스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 결과, 얇은 15μm 두께의 맥신/CNT 야누스 필름은 X-밴드 마이크로웨이브에서 72dB의 전자파 차폐 성능, 0.09이하의 적외선 방사율, 우수한 적외선 감지 민감도등 뛰어난 다기능 특성을 동시에 구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작된 필름은 우주환경을 모사한 극저온 및 급격한 충격에서도 기계적·구조적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하여, 기존의 소재들을 능가하는 경량화, 유연성, 기계적 강도, 극한환경 내구성, 전자파 차폐도, 및 적외선 은폐 및 감지 기능을 모두 확보하였다. 이번 연구는 전자파 및 적외선 차폐/스텔스 소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군사, 항공우주, 웨어러블 전자장치 등 극한 환경에 강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중견연구자사업 (2022R1A2C3006227), 나노 및 소재 사업(2021M3H4A1A03047327),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미래 모빌리티 동작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주파/고출력 전자파 솔루션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CRC22031-00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Nano Micro Letters, 2024, 16, 216」 (IF 27.4, JCR 분야 1.9%)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내응 교수 연구팀, 생체 촉각기관 모사한 '지능형 인공 촉각 수용기' 개발
2025-05-15신소재공학과 이내응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촉각 인지 시스템에서 착안하여 유사 시냅스의 기능과 구조를 모사한 지능형 인공 촉각 수용기* 어레이*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능형 센서 플랫폼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 촉각 수용기: 외부의 자극 (압력, 진동,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활동 전위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하는 역할 * 어레이: 단일 소자가 아닌 다수의 소자로서 집합적으로 동작하도록 제작된 구조 최근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역할은 전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피지컬 AI(Physical AI)는 미래 산업에서 자율 시스템의 핵심 기반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피지컬 AI에서 데이터 입력은 센서를 통해 시작되며, 이에 따라 센서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고성능 신호처리 능력을 갖춘 인체 체성감각계의 메커니즘을 모사한 지능형 센서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인체의 감각기관이 정보를 처음 처리하는 방식, 즉 감각 수용체와 신경 말단 사이의 ‘유사 시냅스 구조’에 주목해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사람의 피부 속 느린 적응형(메르켈)과 빠른 적응형(파시니안) 촉각 수용체에서 영감을 받아, 두 가지 적응 특성을 모두 반영한 16개의 감각 센서부와 시냅스부(시냅틱 트랜지스터)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생긴 마찰전기 센서층과, 자극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시냅틱 트랜지스터를 단일 구조로 구현한 것으로, 느린 자극과 빠른 자극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실험을 통해, 이 센서는 기계적인 자극의 강도·빈도·형태에 따라 시냅스 가중치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전체 데이터의 10% 이하만을 활용해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질감과 표면 패턴을 인식할 수 있어, 기존 기술에 비해 데이터 처리 효율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감각 자체에 인공지능적 기능이 내장된 센서는 초저전압, 초저전력, 고효율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능형 로봇, 뉴로모픽 감각 시스템, 웨어러블 전자피부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외부 환경 데이터를 센서 단계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어, 향후 고속·고효율 자율 AI 시스템 구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자지원,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 사업, 교육부의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중점연구소지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성균관대 홍석주 석박통합과정생과 이유림 박사, 아타누 배그 박사가 공동제1저자로 참여하였고, 이내응 교수가 교신저자로 진행한 이 연구 성과는 재료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학술지‘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에 25년 4월 28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Bio-inspired artificial mechanoreceptors with built-in synaptic functions for intelligent tactile skin ※저널명: Nature Materials ※저자명: 이내응(교신저자), 홍석주, 이유림, 아타누 배그(제1저자), 김효수, Trang Quang Trung, M Junaid Sultan, 문동빈 (공동저자) 인간의 느린적응와 빠른적응 촉각 수용체가 동시에 모방된 초고효율, 초고전력, 초저전압 지능형 인공 촉각 수용기 개발 (왼쪽부터)성균관대 이내응 교수, 홍석주 석박사통합과정생, 이유림 박사, 아타누 배그 박사



 발전기금
발전기금